-
[12월 116호] 지렁이의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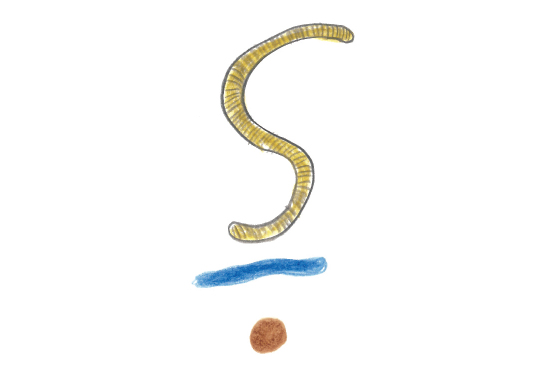
내 지렝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었읍니다
천년동안만 밤마다 흙에 물을주면 그흙이 지렝이가 되었읍니다
장마지면 비와같이 하눌에서 날여왔읍니다
뒤에 붕어와 농다리의 미끼가 되었읍니다
내 리과책에서는 암컷과 수컷이있어서 새끼를 나헛습니다
지렝이의눈이 보고싶습니다
지렝이의 밥과 집이 부럽습니다
(백석, 〈나와 지렝이〉 전문, 《조광》, 1935. 11)
연극 〈백석 우화〉를 보러 갔다가 백석 역을 맡은 배우 오동식이 긴 의자에 누워 읊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을 듣고 있으니 눈물이 났다.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어두어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부분)” 연극을 보는 내내, 연극이 끝난 후에도 관객들은 울고 있었다.
청년 시절 모던보이 백석의 이미지에 익숙하던 터라 1980년대 중반 북에서 찍은 사진 속 늙고 야윈 그 모습이 낯설다. 북에서 보낸 어려운 시간들이 고스란히 묻어나는데,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맑아 보인다. 제대로 된 작가로서의 생활을 거의 못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인이었다. 남한에서 시를 쓰다가 북에서 긴 세월을 살았던 그는 끝내 자유로이 맘껏 자신의 문재(文才)를 펼치지 못했다. 정치적 상황 때문이다.
시 〈나와 지렝이〉는 천진하다. “지렝이의눈이 보고싶습니다.”라는 구절이 다정하다. 지렁이는 커서 구렁이가 되고, 흙에 물을 주면 지렁이가 되고, 비가 오면 하늘에서 같이 내려오고, 미끼가 되고 새끼를 낳고… 지렁이는 작고 미약한데, 끈질기게 살아가며 모두에게 유익하다. 지렁이는 말이 없고 투쟁하지 않고 조용한데, 잘 먹고 잘산다. 적어도 시인의 눈에는 그러했나 보다. 그래서 백석은 “지렝이의 밥과 집이 부럽습니다.” 한다. 이상하게 힘이 되는 시다.
우리는 모두 지렁이가 아닐까. 일제 강점기와 분단의 상황에서 삶의 중심을 잃고 흔들려야만 했던 백석처럼 우리는 어쩌다 우연히 하늘에서 지렁이와 같이 내려와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다. 눈도 귀도 보이지 않는 지렁이지만,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지렁이지만 지렁이는 하늘에서 왔고 후에 구렁이가 될 거란다. 때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보다 더 큰 힘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듯해 무력하게 흔들리고 있지만, 누가 알겠는가? 진정한 지렁이의 능력을. 그런 희망이 있어 이 시가 좋다. 백석의 동화시 〈굴〉에서도 이러한 생명이 지닌 힘이 그려진다. “굴은 저 혼자 자라간다. 굴은 엄마 아빠 없이 저 혼자 자라간다. (…) 굴은 이렇게 살며 사나운 고기가 와도 무섭지 않다. 굳은 껍지를 꼭꼭 닫으니까, 세찬 물결이 와도 무섭지 않다. 굴은 껍지를 꼭꼭 닫으니까, 굴은 가엾구나, 그러나 굴은 용하구나!(동화시 〈굴〉 부분)”
대학교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고 교정을 가로질러 돌아오는 밤길에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비친 바닥을 보니 온통 지렁이였다. 빗물과 지렁이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지렁이가 꿈틀댔다. 징그러운데, 오감이 깨어나는 듯한 기쁨이 있었다. 빗줄기는 시원하고 여름은 비와 지렁이로 자연의 생명력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그리고 나는 스무 살을 갓 지난 여자애였다. 생명은 그렇게 비를 타고 내려와 작은 눈을 갖고, 밥과 집을 갖는 것. 당신의 작고 맑은 눈이 보고 싶은, 겨울이 오고 있다.
글 그림 이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