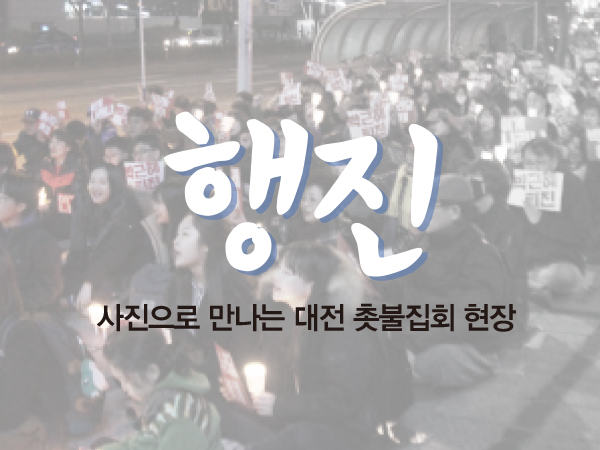-
[12월 116호] 별빛과 전구사이의 송년가
낙엽이 지고 허망함을 느낄 사이도 없이 바로 빈 나뭇가지에 성탄 장식용 전구가 화려함을 자랑한다. 올해도 예외 없이 도시의 가로수는 낮에 보면 죄수처럼 온몸에 전선을 감고 서 있다. 그 덕분에 봄이 오기 전까지 도시의 밤은 쉴새없이 깜빡이는 휘황한 전구 불빛 속에서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는다. 물론 그 불빛을 보며 즐거워하며 도시의 삶을 행복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겨울의 본질은 휴식이고 텅 빈 여백 같은 것이다. 겨울을 제대로 느끼려면 캄캄하고 조용한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성탄 전구를 피해 조용한 시골마을로 가 본다. 그곳에는 떨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밝은 별이 빛난다. 휘황하지 않아 더 빛나는 겨울밤의 별빛이 오롯하니 좋다.
초겨울 저녁, 해가 진 뒤 서쪽하늘에 나타나는 개밥바라기별 금성은 밤의 오프닝이다. 그리고 언제나 빠지지 않는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겨울하늘의 웅장한 오리온 자리와 눈이 시릴 만치 밝은 시리우스, 북극성, 은하수들은 밤하늘의 전설과 이야기를 끝없이 풀어내 준다. 그러다 마침내 금성은 밤사이 하늘을 다시 돌아 새벽 동쪽하늘에 다시 떠서 밤을 마무리하는 클로징 역할도 맡고 있다.
우리가 보는 별은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육안으로 바라보는 별은 이미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하니 별을 본다고 하는 것은 그저 빛이 이제야 지구에 도달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허상을 보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빛을 본다는 측면에서 별보기는 추억 보기와 다름 없다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된다. 실제 내가 바라보는 별은 반짝반짝 아름다움의 결정체 같지만 정작 그 별의 실체는 그리 아름답지도 않고, 오히려 달 표면의 분화구나 시커먼 흙처럼 암울한 상태일 수도 있다. 단지 멀리서 보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다. 아스라한 거리에서 바라보는 별보기처럼 세상도 기억도 멀리 놓고 볼 때 아름다울까? 그룹 비지스의 그 유명한 노래 <5월 1일(First Of May)>을 살펴보면 싱그러운 녹색이 샘솟는 5월을 노래하고 있지 않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 키보다 컸지. 우리의 소꿉장난은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 시절은 왜 가 버리고 말았는지. 누가 가지고 가 버렸는지. 이제 우리는 자라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내려다보게 되었지. 옛날을 얘기하지 말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비지스의
글 스토리밥 작가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