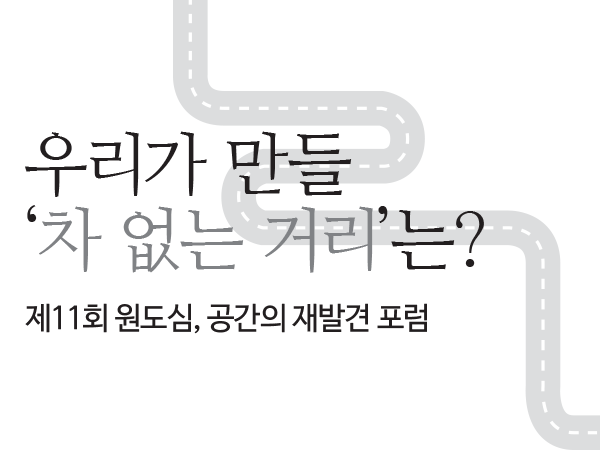-
[5월 109호] 1층과 2층의 경계짓기
대전시 154만여 인구 중 77%가 행복하다는 느낌으로 살아간다는 조사 결과가 어떠세요? 아니면, 주관적 건강 평가에서 8대 특, 광역시 중 최고였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 시민 대다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럼 나만 행복하지 않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가 싶어서 자괴감도 살짝 밀려오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낯선 사람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실제 생각이 어떻든 일단 행복하다고 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 아닐까요? 이런 조사결과는 2015년 연말에 대전시가 발표한 ‘2015 대전 사회 지표’에 나옵니다.
그런데, ‘2015 대전 사회 지표’ 결과에서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전 이미지 향상 요소를 묻는 질문에 과학도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나 교통 요충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럴 듯했습니다. 대전천을 기준으로 동서 격차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싶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뒤를 이어 세 번째로 꼽은 것이 원도심(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주변) 활성화였습니다. 이는 축제, 포럼 등 국제행사 개최나 친환경 도시 조성, 대표적인 관광상품 개발, 문화예술 대중화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결과입니다.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친 걸까요? 우리 도시에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작용했겠지요. 언론 보도, 빈번하게 열린 관련 포럼과 세미나 따위요. 또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지역 사회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서 이런 포럼과 세미나에 참여하거나 관심을 둘 가능성이 높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들 역시 우리 도시에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의제가 확산되는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겠지요.
여기에 하나 더, 감상적인 분석을 덧붙이면 원도심이 지닌 장소성이겠지요. 비록 현재는 원도심에서 살거나 직장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대전 시민은 원도심을 영원한 ‘시내’로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시내’가 쇠락해 가는 꼴을 마냥 지켜보는 것은 기억에 대한 배반일 수도 있습니다. 다 폐허로 만들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드는 원도심이 아니라 고치고 수선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며 펼치는 재생이 더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런 ‘도시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시내로 기억하는 도심이 완전하게 다른 모습이 되는 건 왠지 씁쓸한 결과이니까요. 여하튼,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면 대전 시민은 원도심을 사랑합니다.
특정한 도심 구역을 오랜 시간 걷다 보면 작은 변화와 어떤 특징 같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가게 자리는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반 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저주(?)를 받았다든지, 어떤 가게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지 않고 주인이 직접 인테리어를 하거나 계속 손을 보면서 가게의 외형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바꿔나간다든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낸 건축물은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묘하게 닮은 구석이 보입니다. 생김은 전혀 다르지만 풍겨내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작은 변화도 도드라지게 눈에 띄는 모양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원도심에는 대전 시민이 ‘시내’로 기억하는 그 시점을 떠올리게 만드는 다양한 요소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시점의 기억을 간직한 풍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을 걷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지요. 몇 년 전, 부산을 기반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구헌주 작가가 대흥동을 해석해 작품을 남겨 놓은 적이 있습니다. 몇몇 곳에 여전히 작품이 남아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작품은 산호다방 벽면에 그린 작품입니다.

서울치킨과 도시여행자가 있는 바로 그 사거리에 있지요. 옷걸이에 걸린 티셔츠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티셔츠는 원래 있던 벽면을 그대로 활용했고 주변에 색을 칠해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당시, 구헌주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흥동을 비롯한 원도심을 돌아보면 낡은 것을 완전히 없애고 그곳에 새로운 것을 채운다기보다는 옛것이 그냥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덧대는 느낌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느낌에서 오래된 세탁소에 그곳에 걸려 있는 옷이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요즘 원도심을 거닐다가 구헌주 작가가 이야기한 그 ‘느낌’과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민학교 과학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에 다양한 액체가 빨려 올라가는 것을 보았을 때 받은 충격과 비슷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 믿었던 제게 거꾸로 올라가는 물은 충분히 신기했으니까요.

건축물 1층에 새로운 인테리어 자재와 요소를 덧대면서 건축물 전체에 액체가 빨려 올라가듯 생긴 변화가 흥미롭더라고요. ‘1층과 2층 사이의 경계 짓기.’ 일부러 경계를 지으려 한 것이 아니기에 적절한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그건 인상적인 변화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 자리를 지켰을 건축물 1층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고, 필요한 만큼만 새로운 꾸밈과 장식 요소로 치장하면서 경계가 또렷해지니까요. 길 건너에 서서 그 경계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시간의 흐름과 욕망, 사라진 것들과 사라질 것들에 관해 생각합니다.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이 교차하는 지점은 늘 극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석양 노을과 여명처럼요. 도시에서 마주친 풍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