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95호] 수없이 돌아 다시, 미술 그 언저리에 오다_황영기 작가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 살면서 ‘왜’ 미술이었는지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어린 시절 선생님의 한마디다. 국민학교 때 미술대회에 나갔다. “데생을 참 잘한다.”라고 말하던 담임 선생님의 말이 계속, 가슴에 남았다. 잘하는 것, 잘하고 싶은 게 생겼던 모양이다. 미술을 공부하지는 못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 전선에 나가야 했다.
열한 살이었다.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때 선택한 것도 ‘미술 언저리’였다. 극장에서 간판 만드는 일이었다. 5~6년 정도 했던 것 같다. 돈도 벌면서 재미있다고 느끼는 일이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메인 간판에 손도 대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빨리 메인이 되었다. 그러다 박용래 시인을 소개받았다. 박용래 시인을 통해 ‘순수 미술’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은 접하지 못했던 길이었다. 시인이 소개한 미술을 공부하는 사람, 시를 쓰는 사람을 만나며, 더 배우고 싶었다. 화가가 되고 싶었다. 왜 그렇게 화가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절실하게 화가가 되고 싶었다.
더 안정적으로 미술을 접하는 길, 좋아하는 미술을 하면서 돈을 벌 길을 찾으려고 서울에 올라갔다. 명화 카피, 패션 디자인 등 일을 하며 3~4년 정도 서울에 머물렀다. 그리 안정적이지는 못했다. 다시 고향 대전에 내려와 의상실과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다. 죽 ‘미술 언저리’였던 것 같다.
“많은 일을 했어요. 한동안 대전에서 일하다가 1979년도에 아라비아에 1년 동안 다녀오기도 했죠. 1980년도에 고향에 다시 내려와서 액자 일 배워서 액자가게도 2~3년 정도 했어요. 그러다 한동안은 그림만 그렸어요. 85년도부터 한 5~6년간은 직업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림만 그렸던 거죠.”

개입_digital work and print_297x420_2015
30대 초중반이었다. 올해 예순다섯, 열한 살 때부터 직업이 있던 작가가 잠깐 ‘직업’이 없던 시절이었다. 그림을 그렸다. 전시도 꽤 했다. 현대미술협회에도 가입하고, 그룹전이며, 개인전이며 틈틈이 그린 그림으로 꾸준히 전시하고,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완전히 그림만 그릴 수 있는 날은 길지 않았다. 딸 아이가 자라면서 마냥 하고 싶은 일만 좇을 수는 없었다. 또 다시 일을 시작했다.
늘 미술 언저리에서 화가를 꿈꾸던 작가는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 ‘화가’라는 게 허상 같은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허상을 좇았구나.’라는 생각이었다. 과도기였던 것 같다. 한동안은 전시도 하지 않고, 협회 활동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 그건 멈출 수가 없었다. 어떤 때는 원망스럽기도 했다. 미술을 알지 못했더라면, 잘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았더라면, 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만 없었더라면,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글쎄요. 왜 그렇게 그림이 좋았을까….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내겐 예술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로 맞이한 탈출구였어요. 늘 화가가 되는 걸 기대하면서 살아왔고, 화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언저리에 머물렀던 거니까요. 그러다가 점차 회의가 느껴졌어요. 모든 게 별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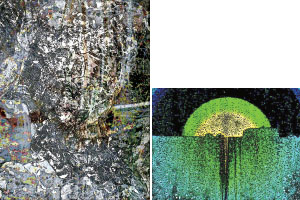
(왼쪽 사진) 개입_digital work and print_297x420_2014 (오른쪽 사진) 개입_digital work and print_297x420_2014
네모난 프레임 바깥으로 빠져나온 작가는 다시 세상에 뛰어들었다. 10여 년 전부터 작가가 하는 일은 안경원에 렌즈를 배달하는 일이다. 오전 열 시부터 오후 일곱 시까지 하는 일이다. 최근 생긴 부업은 새벽 5시부터 세 시간 정도 수건을 배달하는 일이다. 둘 다 ‘그림 언저리’ 밖의 일이었다. 그래도 꾸준히 그림을 그렸다. 어떤 때는 괜한 손재주를 준 누군가를 원망하고, 어떤 때는 그래도 이런 손재주를 준 누군가에게 감사하며 그림을 그렸다.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완전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화가로 큰 성공을 하기보다는 예술을 내 나름의 안식처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 없는 운명이라면 편안하게 받아들여야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딸 아이가 SNS 하는 법을 알려줬어요. 지금 외국에 있거든요. 자기랑 대화하자고 알려줬던 거죠. 일하면서 사진 찍은 것을 변형해서 SNS에 올리기 시작한 게 2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서 재미를 붙였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 관련 애플리케이션 여러 개를 다운 받아서 이것저것 써보기 시작했어요. 사진 찍고, 편집하면서 하나씩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전 세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세계 여러 나라 사람이 제가 올린 걸 보고 댓글을 달고, 자기들이 속한 작가 그룹에 초대하고, 제 작품을 공유하더라고요. 그런 반응을 보는 게 재미있어요.”
매일 전시하는 마음으로 SNS에 사진을 올린다. 처음엔 꽃으로 시작했다. 돌 틈에서 자란 꽃, 천변을 거닐다 만난 꽃, 도시에서 만난 꽃을 사진으로 담고, 애플리케이션으로 변형했다. 그러다 도시에서 만나는 풍경을 하나씩 사진에 담았다. 애플리케이션 몇 개를 가지고 사진을 변형해 아무 제목 없이 그 날 날짜만 적어서 SNS에 올린다. 이름을 달 필요도,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
“SNS에만 올리던 사진을 갤러리에서 전시한 건 처음이었어요. 예전에 했던 회화작품이랑은 전혀 다른 형태였기 때문에 좀 떨리는 마음이 있었죠. 예전 회화 작품도 보면, 다소 우울하고 어두웠어요. 색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최근 사진 작품은 색이 많이 쓰이는데도 좀 그런 느낌이죠.”

개입_digital work and print_297x420_2014
인생의 본질은 슬픔에 가까운 것이라고 작가는 이야기한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있을 것이라고, 작가가 아무리 기쁨을 담으려고 해도 누군가는 그 본질에 있는 슬픔을 본다고 여긴다.
“제 안에 있는 슬픔을 작품에서 숨길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유희겠죠.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진짜 세상을 제대로 본다면, 유쾌할 일이 정말 없어요. 그저 살아 있는 것에 감사를 느끼는 거죠. 기쁨은 잠시 느끼는 착각이라고 여겨요. 누군가 그게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일 수도 있겠죠. 결국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다가 그냥 떨어지면 그만 아닐까….”
살다 보니 흐르는 강물도 특별하게 보인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겨울 산도 젊은 날 보았던 것과는 다르게 보인다. 사물을 보는 눈도 소양도 조금씩 변해가는 게 아닐까 싶다. 이제는 어떤 원칙을 세우고 작품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자유롭게 미술 언저리에서, 예술과 함께 살고 싶다. 더 열심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죽 그렇게,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다가 떨어지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