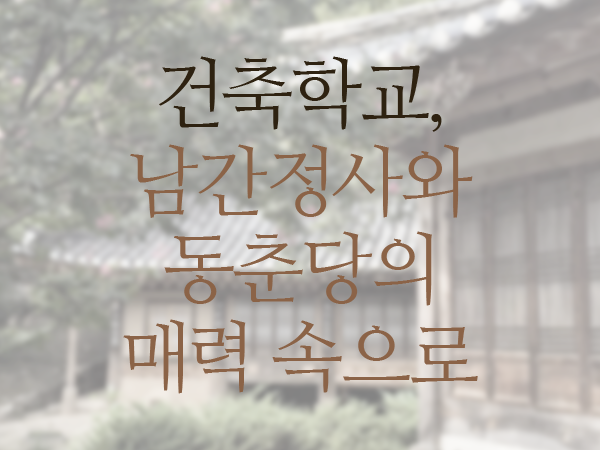-
[4월 108호] 봄은 살아서 움직인다_대덕구 송촌동


문득 만난 봄이 낯설었다. 겨우내 남모르게 옴작거렸을 꽃맹아리가 시선을 붙들었다. 3월이었다. 화분 집 앞에서 아주머니 두 명이 작은 봉지에 흙을 나누어 담고 있다. 새 몇 마리가 울어 댈 뿐, 인적은 드문 동네에서 처음 만난 이들이다. 도란도란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를 따라 옆자리에 잠시 앉았다가, 몸이 아파서 오래 얘기를 못 한다며 경로당을 가리키는 아주머니의 손길을 따라 발걸음을 다시 옮겼다.
아직 이른 아침, 송촌 제1경로당은 한 할머니가 지키고 있다. 올해로 아흔하나인 할머니는 20년쯤 전에 송촌동에 왔다. 그래서 동네에 관해 특별히 잘 아는 건 없다고 하면서도 할머니는 이내 사는 곳 자랑을 시작했다. 종종 이야기의 내용이 오락가락했는데,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송촌동이 살기 좋은 곳이란 거였다. ‘신작로’만 건너면 대전복합터미널이 있고 교통이 편리하며 터미널에는 ‘백화점’도 있다. 그리고 송촌동에는 ‘정수소’가 있는데, 이 때문에 발전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한다.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경로당이 북적댄다. 어느새 자리를 잡은 한 할머니가, 대체 백화점이 어딨느냐고 말을 잇는다. 송촌동 근처에는 가게 같은 것은 있지만, 백화점은 없다고 말한다.
“옛날에는 여기가 산이고 논이고 그랬어. 땅 팔아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부자들 많아.”
신문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봐야 한다, 무 꼭다리는 안 버리는 게 좋다, 손님이 왔는데 왜 다들 하고 싶은 말만 하느냐, 모두가 언성 높여 자기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도 할아버지가 윤보선과 한 일가였다는 윤 씨 할머니의 이야기 앞에서는 순서를 양보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배운’ 할머니라고 했다.
아흔둘 윤 씨 할머니는 송촌동에 온 지 20년쯤 됐다. 가장 최근에 살고 있는 곳인데도 이상하게 송촌동에 관한 기억은 적다. 송촌동 이야기를 시작하려, ‘조선 사람’이었던 시절 이야기를 꺼낸다. 한 세기가 가깝게 이 세상을 살면서 옛 기억은 점점 선명해지고 현재와 가까운 시간은 오히려 희미해져만 간다.
송촌동은, 한 세기를 살아온 삶을 매듭지을 공간이다. “대전에서 송촌동이 집값이 가장 싸.”라고 말하면서 남부러울 것 없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옛 시절 얘기를 꺼내지만, 그래도 아침밥 챙겨 먹고 노인정에 나오는 송촌동에서의 날들이, 지금의 행복한 윤 씨 할머니의 하루다.
주택, 상가와 원룸 건물들이 늘어선 송촌동의 하루는 그렇게 흐른다. 아이들은 학교에 나가고 젊은 사람들은 일터로 향하고 조용한 동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옛 생각에 잠긴다.
소란한 사이, 방문이 열린다. 이 동네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아흔셋의 할머니가 들어온다. 송촌동에 산 시간은 그 긴 인생 중 20년 정도가 될까. 이야기를 청하자 할머니가 대뜸, 손을 꽉 부여잡는다.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하네.”

은진 송씨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 중엔 은진 송씨와 연이 있는 이는 없었다. 저 너머로 가면 은진 송씨가 많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뿐이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은진 송씨인 송명의가 회덕 황씨와 결혼하면서 회덕에 자리를 잡았는데 송촌이 가장 큰 동족 마을이었다. 송촌동 이름의 유래다. 현재 송촌동은 개발제한구역인 경부고속도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뉜다. 서쪽 지역은 개발이 되어, 어느 도심이나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상가, 원룸 건물이 늘어섰다.
경부고속도로와 접해 있는 선비마을 아파트가 생기고 나서 송촌동이 개발됐다고 한다. 선비마을 아파트는 5단지까지 있는데, 법동에 가장 먼저 지은 1단지는 1999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송촌 제1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도 대부분 송촌동에 온 지 20년 정도가 되었다고 하니, 선비마을 아파트가 만들어진 때와 시기가 비슷하다.
이보다 더 오래 산 이들이 기억해 준 옛 송촌동은, 산이고 들이었다. 몇 가구 살지 않았던 곳이었다. 마을에 흐르던 도랑 옆에서 농사를 짓고 도랑에서 쌀을 씻어 먹었던 곳이다. 그랬던 도랑을 복개하고 그 위로 사람들이 살고 도로가 나고 자동차도 지나다닌다.
“산 다 밀어서 집 짓고 한 거야. 서운하냐고? 내 땅 아니니께 서운할 것도 없지. 공기는 좋았었지. 어렵게 사느라 옛날 생각이나 나는 줄 알아?”
해가 높이 떴다. 동네는 여전히 조용하다. 이번에는 선비마을 아파트 쪽으로 향했다. 한참을 걸어 큰 도로 하나를 건너니 송촌고등학교 뒤로 5단지가 보인다. 계족산, 성재산 줄기가 뒤쪽으로 펼쳐지고 앞쪽으로는 동춘당공원이 있어 대단지 아파트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삭막함이 없다. 마침 봄이 시작되는 기운과 어울려 단지는 평화롭고 밝다.

선비마을 5단지 노인정에서 만난 이들 대부분은 입주하면서 송촌동과 연을 맺었다. 있을 거 다 있고 산이 있어 공기가 좋은 곳, 선비들이 살았던 곳에 사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한 시절이다.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동춘당(同春堂) 공원으로 향했다. 조선 효종 때 대사헌, 이조판서, 병조판서를 지낸 동춘당 송준길의 별당인 동춘당이 있는 공원이다. 숙종 4년에 우암 송시열이 현판을 썼다. 동춘은 ‘살아 움직이는 봄과 같아라.’라는 뜻이다.
봄이 막 살아 움직이려 하는 때다. 셀 수도 없는 봄이 이곳에 왔다가 떠나서 갔다. 근 몇 십 년간의 변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아파트에, 상가와 원룸 건물에 찾아오는 봄이 겨울의 흔적을 품는다. 동춘당 공원 근처의 송촌초등학교, 송촌중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