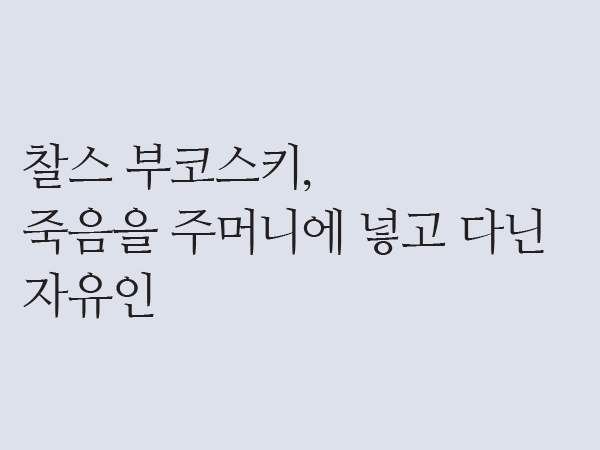미국 소설가 찰스 부코스키의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라는 책을 틈틈이 읽었다. 2주전 쯤이던가, 다른 도시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머리를 창에 기대고 비몽사몽 간에 상념에 잠겨 있을 때였다. 그때 문득 최근에 읽은 『보르헤스의 말』 이란 책이 떠올랐다. 그 책에서 보르헤스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자기 자신이 여전히 보르헤스인 것이 너무 낯설고 언짢다는 말을 했다. 나는 말짱한 대낮에도 가끔 그런 생각에 흠칫, 놀라곤 한다. 나는 내가 하필이면 다른 누구도 아닌 김모 씨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누군가인 것이 너무 낯설다. 나는 다른 이런저런 누군가로 태어났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김모 씨라는 존재로 태어난 것, 이것이 너무나 부조리하고 마치 내가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음모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이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 우연이라는 가명을 쓴다.”라고 썼다. 나는 굳이 나일 필요는 없었으리라. 여자일 수도, 혹은 다른 인종일 수도, 혹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체일 수도 있었을 터이다. 사실 삶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탄생과 죽음 사이의 짧은 임시직에 불과한 것, 나는 언젠가는 다시 이 우주를 만든 순수 에너지 상태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선 나도 너도 없는 모두가 하나인 완벽한 합일 상태로 머물 것이다. 나는 지금, 마치 삶이란 세계에 잠시 파견근무 혹은 유형에 처한 것일 뿐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은 또 다른 생각으로 뻗어가기도 한다. 즉 내가 인간이지만 다른 무수한 가능성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지금 현재의 상태인 것이 너무나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지곤 하는 것이다. 나는 어쩌다 하필이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었고, 지금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좌충우돌 우왕좌왕 허겁지겁 어리바리 살다 문득 정신을 차려 보니 지금의 내가 되었다.
나는 기차 안에서 인생 시계를 되돌려 내가 원할만한 혹은 지금과는 다른 삶의 형태들을 살아가는 나를 상상해 보기 시작했다. 마치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 주인공에 감정이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설 주인공의 삶을 체험하듯이. 배우가 된다거나, 외교관이 되거나, 정치가, 사업가, 운동선수, 의사, 성직자, 연예인, 음악가 등등 수많은 삶을 떠올려 보았다. 탄생에서 성장하고 그러는 와중에 겪을 만한 고충과 성취, 행복과 불행, 그런 삶들에 따르는 온갖 크고작은 굴레들 등등…. 하, 그러나 역시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서머셋 모옴의 말처럼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았다. 역시 고대 희랍 현자들의 말처럼, 최선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고, 차선은 바라건대 고양이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어떤 삶이 좋을까? 그나마 재미있고, 더 자유롭고, 더 신나는 생은 어떤 것일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굴리던 어느 순간에 불현듯 찰스 부코스키가 떠올랐다.
“그래, 부코스키가 있었지!”
그제서야 내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평생을 술과 경마, 여자들 사이를 분주히 오가면서 마음 가는대로 신나게 살았던 남자. 쓰는 글조차도 자신의 삶 자체를 이야기로 꾸며내고, 그 글쓰기도 마치 분노의 주먹질을 휘두르듯 거침없고 야성적이고 직설적으로 쏟아낸 남자. 물론 그도 12년간 고된 우체국 생활을 하며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여전히 자유로웠고, 거침이 없었고, 한 마리의 야생마처럼 이 세상 속을 휘젓고 다니지 않았던가!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란 책은 그가 백혈병을 앓으며 죽음에 다가가고 있던 말년에 쓴 일기 같은 글들을 모은 책이다. 역시, 부코스키 답게 여전히 직설적이고 생기발랄하고 마초 같은 뜨거운 문장들을 발산하고 있다. 그의 저잣거리 언어는 나에게 언제나 깔깔 웃게 만든다. 그의 통렬하고 직설적인 문체는 마치 막힌 하수구가 뻥 뚫리는 듯한 유쾌한 쾌감을 준다. 그렇다, 부코스키의 글은 언어로 만들어진 <뚫어 뻥>이다.
그에겐 죽음조차도 하찮아 보인다. 뭐 죽는 게 대수야? 하는 얼굴.
“대다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없다. 제 자신의 죽음이건 남의 죽음이건, 사람들에게 죽음은 충격이고 공포다. 뜻밖의 엄청난 사건 같다. 염병, 어디 그래서 되겠나. 난 죽음을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때때로 꺼내서 말을 건다. 이봐, 자기, 어찌 지내? 언제 날 데리러 올거야? 준비하고 있을게.”
부코스키의 문장들은 그가 온몸으로 생의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면서 얻어낸 피와 살과 뼈로 쓰여진 언어들이다. 그는 자신의 삶과 몸으로 겪고 느낀 것들만을 언어로 벼려낸다. 『우체국』에서는 사회의 밑바다에서 말 그대로 생존하기 위해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던 노동의 땀과 눈물이 배여 있다. 포드주의적이고 관료제적인 효율성이 지배하는 우체국으로 상징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대신하여 그는 끊임없이 저항하며 개인의 자유와 삶을 옹호하는 것이다.
『여자들』에서는, 그저 사랑과 섹스에 미친 발정난 수컷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점잖은 척, 도덕적인 척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컷 본능을 맘껏 발산하며 수컷적인 삶의 진실, 사랑과 섹스의 진실을 벌거벗은 몸으로 탐색하고 있잖은가? 일부 여성 독자들은 그의 그런 마초주의에 질겁하고,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도덕이 삶보다 우위일 순 없고, 삶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탐색하려는 그의 본능은 인간 본능, 아니 수컷 본능의 가장 낮은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여자들』에서는, 그저 사랑과 섹스에 미친 발정난 수컷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점잖은 척, 도덕적인 척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컷 본능을 맘껏 발산하며 수컷적인 삶의 진실, 사랑과 섹스의 진실을 벌거벗은 몸으로 탐색하고 있잖은가? 일부 여성 독자들은 그의 그런 마초주의에 질겁하고,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도덕이 삶보다 우위일 순 없고, 삶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탐색하려는 그의 본능은 인간 본능, 아니 수컷 본능의 가장 낮은 곳까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에겐 사랑, 도덕, 사회, 이런 것보단 자기 자신의 자유가 더 소중한 것이다. 그가 마초 상놈인 것은 물론 맞다. 그래도, 나는 그를 미워할 수가 없다. 그는 평생 술, 경마, 여자에 빠져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삶에 진지했고, 삶의 온갖 굴레에 맞서 조금도 주눅들거나 여기저기 눈치나 살피면서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오로지 정면으로 돌파해나가는 용기와 과단성을 보여주었으니까. 그의 소설 속 분신인 치나스키 뿐 아니라, 부코스키라는 인간 자체가 어찌보면 『희랍인 조르바』에 나오는 그 조르바의 자유로움, 바로 그걸 다른 버전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지. 누구나 꿈꾸지만, 용기부족과 관습적 굴레에 얽매여 사는 쪼잔함 덕에 실천할 수 없는 그 자유를.
물론 부코스키가 자유를 추구했다고 해서 진짜로 자유로웠던 건 아니다. 그는 지독하게 가난하기도 했고, 술과 경마로 돈을 탕진하곤 했고, 세 끼 밥을 위해 온갖 험한 일을 다 해야만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날카롭게 벼려 그것을 글쓰기로 승화시켰다. 자유롭고자 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드는 온갖 현대적인 삶의 인간조건을, 온몸으로 부닥쳐 나가는 그의 육체로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켜 보였다. 그것이 그의 글쓰기였다.
“난 쉰 살까지 일반 노동자로 일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여서 살았다… 내가 글을 쓸 때 허튼 수작을 내려 놓을 줄 아는 건 그 난장을 겪은 덕이라고 난 생각한다. 이따금 얼굴을 진흙탕에 처박을 필요가 있고, 감옥이 뭔지 병원이 뭔지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나흘씩 먹지 못하고 지내는 게 어떤 느낌인지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정신 아닌 여자들과 같이 사는 건 척추에 좋다고 생각한다. 조임틀에 끼였다 풀려나면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의 자유로운 삶의 정신, 거침없는 독설, 야생마 같은 기질이 부럽다. 내가 기차 안에서 내 삶과 그리고 가능한 이런저런 삶들을 떠올리리다 문득 부코스키적인 자유 정신을 떠올렸고, 득달같이 서점으로 달려가 『죽음을 주머니에 넣고』를 산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상, 가장 좋은 삶은 왕의 삶도, 거창하고 번쩍이는 어떤 삶도 아닌, 바로 자유롭게 사는 삶이다.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삶, 부코스키가 말했듯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는 삶이다.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는 게 인간이 짊어지는 삶이라면, 생을 깊이 겪고, 그러한 겪음 속에서도 최대한 자유를 향유하는 삶이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