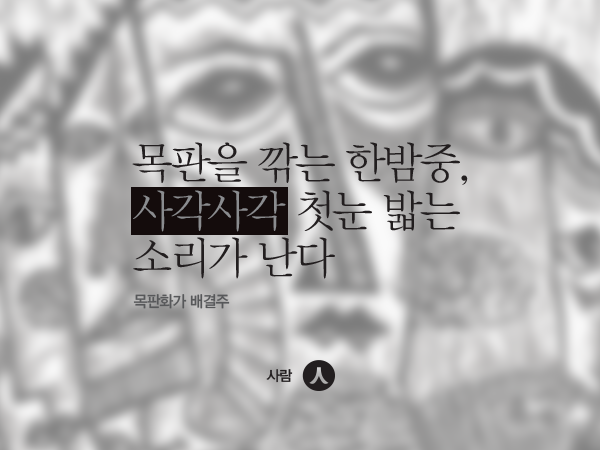-
[1월 105호] 유성구 금탄동 - 고요한 외침이 있는 북쪽 끝 마을

반듯하게 쌓인 돌 위에 포도 주스 팩이 가지런하다.
비락식혜, 감, 젤리도 정성스럽게 놓였다.
지난밤 내린 눈도 머금고, 사람들 지나간 자리에 날린 흙 먼지가
고스란한 걸 보아 제를 지낸 지 몇 달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아직 마을에 서낭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낭단 위에 놓인 음식이 몇 년씩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조금 지나니 마을 입구다.
커다란 돌이 ‘금탄동’이라고 마을 이름을 알린다.
비락식혜, 감, 젤리도 정성스럽게 놓였다.
지난밤 내린 눈도 머금고, 사람들 지나간 자리에 날린 흙 먼지가
고스란한 걸 보아 제를 지낸 지 몇 달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아직 마을에 서낭신을 모시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낭단 위에 놓인 음식이 몇 년씩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조금 지나니 마을 입구다.
커다란 돌이 ‘금탄동’이라고 마을 이름을 알린다.
밥 한 끼로 마음을 나눈다
햇볕이 마을 곳곳에 내리쬐었다. 높은 건물이 한 채도 없으니 마을을 둘러싼 산이 꽤 높아 보인다. 마을 입구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니 마을회관이 있다. 회관 앞에서 부산스럽게 굴자 회관으로 들어가는 할머니가 밥 먹고 가라는 말로 객을 붙잡는다.마을 사람 대부분 마을회관에 있었다. 마을 어른들은 아침 나절 회관으로 모인다. 마을회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부엌 겸 거실이 있다. 거실에서는 10원짜리를 가득 쌓아 두고 할머니들이 벌인 고스톱판이 이어진다. 진한 풀색 담요 위 검붉은 화투장이 끊임없이 오간다.
“심심하니까 치는 거여. 동전도 다 여기 두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겨. 뭐 따고 그런 것도 없어. 할마시들 소일거리로 하는 거지. 겨울에는 저녁 먹구 일 철에는 점심만 여기서 먹어.”
할아버지 한 명까지 쓱 자리를 비집고 들어왔다. 점심상 펴기 전까지 화투장이 오갔다. 단출한 마을회관 벽에는 1998년 마을회관을 세우던 때 찍은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걸어 두었다. 마을회관을 세우던 때가 마을에서 가장 큰 경사였다. “이거 생기기 전에는 회관처럼 사람들 모여 놀던 곳이 마을 입구 쪽에 작게 있었어. 그때도 회관이라고는 했지만, 지금처럼 편안하지는 못했지. 회관 짓고 얼마나 좋았다고. 사람들도 어지간히 와서 밥 차려 내느라고 혼났지. 그때 준공식 한다고 손님들 엄청나게 왔어. 마을 사람 다들 한복 입고 잔치한 거지. 있으니 얼마나 좋아.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잖아.”
마을 경계로 강이 흐른다
두산백과에서는 1455년(세조 1) 단종복위운동이 실패한 뒤 사육신의 한 사람인 성삼문의 일가친척이 이곳에 숨어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쓰였다. 마을 사람들은 형성된 시기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6·25전쟁 때 이곳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아 ‘피난 골’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북쪽 끝으로 흐르는 금강이 깊어 강 건너 넘어오기 힘든 마을이었기 때문이다.“강이 무지 깊지. 우리는 보통 신탄으로 장 보러 갔는데, 한 번 나가려면 배를 두 번이나 건너야 했어. 마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배가 있었지. 한 번 나갔다 하면 한나절이었어. 지금은 도로를 잘 놔서 배를 타지는 않지만, 교통이 영 불편해.”
점심 먹을 때가 가까워졌다. 올해 일흔이 된 이 씨 할머니의 “밥 먹어야지.”라는 말에 바닥에 깔린 풀색 담요가 빠르게 사라진다. 경로당에서 가장 젊은 이 씨 할머니가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접시마다 반찬을 덜고, 상을 차린다.
“쇠일 마을이라고 불렀어. 어른들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죽 따라 불렀던 거지. 농사 말고 할 게 뭐 있어. 맨 농사지었던 거지.” 구즉동 주민센터의 자료에는 조선 초기 마을 북쪽에 흐르는 금강에 여울이 있어 ‘쇠여울’이라 불렀다고 한다. 그것이 입말로 줄어 쇠일 또는 금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마을에서 금강 쪽으로 가는 언덕을 ‘북목골’이라 한다. 북목골 넘어 금강 근처에 큰 소막이 하나 있다. 금강 옆으로 조선 시대 말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금을 캐던 금정산이 있다. 금맥이 거미줄처럼 산속에 엉켜 있다 해 금정산이라고 부른다. ‘금탄’이라는 이름은 여기에서 왔다.
“여기는 전부 다 성가야. 마을에 성가 아닌 데가 세 집인가야. 오 씨가 둘이고 이 씨가 하나니까. 예전부터 그랬어. 성가 집성촌이잖아.”

시끄러운 것은 모두 한때다
북적이던 점심시간이 끝나고 마을회관이 조용해졌다. 거실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방 안으로 들어가고, 동네 한 바퀴 산책 가거나 장에 나가려고 채비를 하기도 한다. 오후 1시 20분 즈음이다. 73번 버스가 마을 입구에서 마을 밖으로 나갈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 여덟 대, 130분 간격으로 버스가 온다.“태어나기는 현도면서 태어나고 열네 살에 이사 왔어. 여기가 원래 우리 성가 고향이니까 일로 온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을은 똑같어. 집 새로 하고 길 새로 닦은 게 변했다면 변한 건가. 있던 집도 뜯고, 사람이 들어와 살지 않는 조립식 집 같은 게 생기기도 했어. 조립식 집은 지어만 놓고 사람이 살지는 않아. 글쎄 이 동네가 뜬다 하니까 그런가 봐. 아이고. 말만 그렇지. 언제 떠. 우리 생전에는 안 떠. 평생 농사지었어도 땅 한 되지기 없어. 가긴 어딜 가. 여기서 죽으야지.”
성태경 할아버지는 허리 수술 후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다. 밥 먹고 동네 한 바퀴씩 돌아야 그나마 편안해진다. 마을회관에 앉아 있다가 밥을 먹고 주섬주섬 밖으로 나와 마을을 돌고, 다시 마을회관으로 돌아갔다. 할아버지 사는 동안에 바뀐 것도, 바뀔 것도 없다. 한때 땅값이 오른다는 소문에 땅만 가진 사람들이 얼기설기 조립식 집을 지어 올렸다. 그것도 한때였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다.
할아버지 기억에 마을이 북적북적할 때는 78호까지 살았다. 아이도 많고 어른도 많았다. 그때도 대부분 성 씨였지만, 성 씨 아닌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한동네에 살면서, 한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마시며 쌓인 정은 성이 무엇이라도 관계없는 것이었다.
“서낭단에 제 지내는 사람은 하나여. 마을 사람 모두 거기에 제를 지내던 건 아니고. 지금 그렇게 한 지가 10년인가 됐지. 마을회관에 있는 이는 아닌데. 어쨌든 마을 사람이여.”


돌 더미 위에 마음 한 장씩 함께 쌓았다
“그 사람이 나여.”마을을 다니다 커다란 금색 돼지 저금통이 있는 집 앞에 멈췄다. 사진을 찍고 있는데 집에 있던 한 할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커피 마시고 가.”라는 말에 부엌으로 들어가 할머니 앞에 앉았다. 시장하면 밥을 차려줄 테니 먹고 가라며 식탁으로 앉힌다.
할머니는 안동 장씨다. 대화를 나누다 입구에 있는 서낭단을 묻자 ‘사람들이 말하던 제를 지내는 유일한 사람이 나’라고 말을 꺼낸다. 서낭단을 쌓고, 제를 지내기 시작한 건 20여 년쯤 됐다. 할머니가 원래 신을 모시는 사람은 아니었다. 아들이 아프기 시작해 좋다는 건 뭐든, 해 보지 않은 게 없다. 성심을 다했다. 어느 날 산으로 들어가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아들만 살려 주면 뭐든 한다고 했어. 극도로 가면 무서운 게 없더라고 막내아들인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번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었어 고등학교 방학 때 금강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그 친구가 강에 빠진 거야. 보름 만에 건졌는데 퉁퉁 부어서 나왔어. 그렇게 보지 말라고 말렸는데 기어이 보더니 그때부터 놀라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거지. 돈 많이 내버렸어. 아들 살리느라고. 산에서 내려와서 단을 쌓기 시작했어. 사람들은 모두 못 살린다고 했어. 송장 보고 놀라면 방법이 없다고. 그래도 끝까지 했어. 마을 입구에 돌로 단을 쌓고, 제를 지냈어. 아들 살리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데 못 할 게 없었어. 정성을 다했어. 그러다 사람들이 반대해서 안 했더니 아들을 또 흔들어 놔. 잘못했다고 가서 얼마나 빌었는지. 그때부터 제를 지내는데 북 치고 혼자 다 했어.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데 말이 술술 나와. 내가 학교도 제대로 나온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잘 지내요. 아픈 데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줄 놓는 아들을 보며 한 번도 신을 마주한 적 없던 장 씨 할머니가 신을 만났다.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가 만든 일이었다. 할머니가 제를 지내는 서낭신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킨다. 마을 입구부터 흐르는 강 너머까지가 대전광역시고, 강 건너는 세종시다. 마을에서 기르는 개나, 길고양이도 낯선 사람을 봐도 아무런 경계가 없다. 집 주변을 두른 플라스틱 담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빨래가 걸려 있기도 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걷어 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 집이었다.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는 마을 입구에는 장 씨 할머니가 가슴에 쌓인 돌을 꺼내 차곡차곡 쌓았을 서낭단이 가지런하다. 여전히 마을 경계에서 다소곳이 흐르는 강물은 얼마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신줄 놓는 아들을 보며 한 번도 신을 마주한 적 없던 장 씨 할머니가 신을 만났다. 아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가 만든 일이었다. 할머니가 제를 지내는 서낭신은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를 지킨다. 마을 입구부터 흐르는 강 너머까지가 대전광역시고, 강 건너는 세종시다. 마을에서 기르는 개나, 길고양이도 낯선 사람을 봐도 아무런 경계가 없다. 집 주변을 두른 플라스틱 담장에 아무렇지도 않게 빨래가 걸려 있기도 하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걷어 갈 수 있는, 버스정류장 근처 집이었다. 조용하고 온화해 보이는 마을 입구에는 장 씨 할머니가 가슴에 쌓인 돌을 꺼내 차곡차곡 쌓았을 서낭단이 가지런하다. 여전히 마을 경계에서 다소곳이 흐르는 강물은 얼마나 많은 사연을 담고 있을까.
글 사진 이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