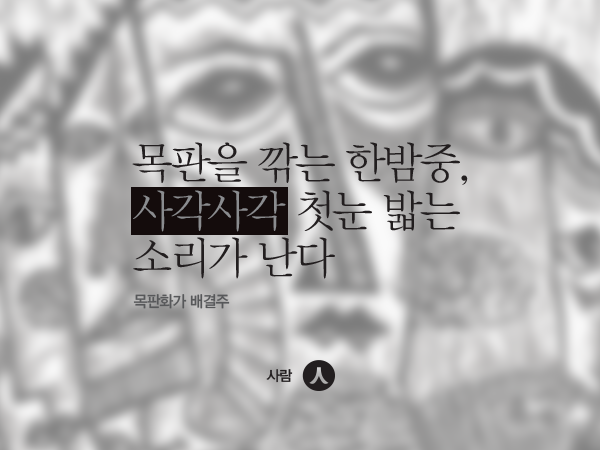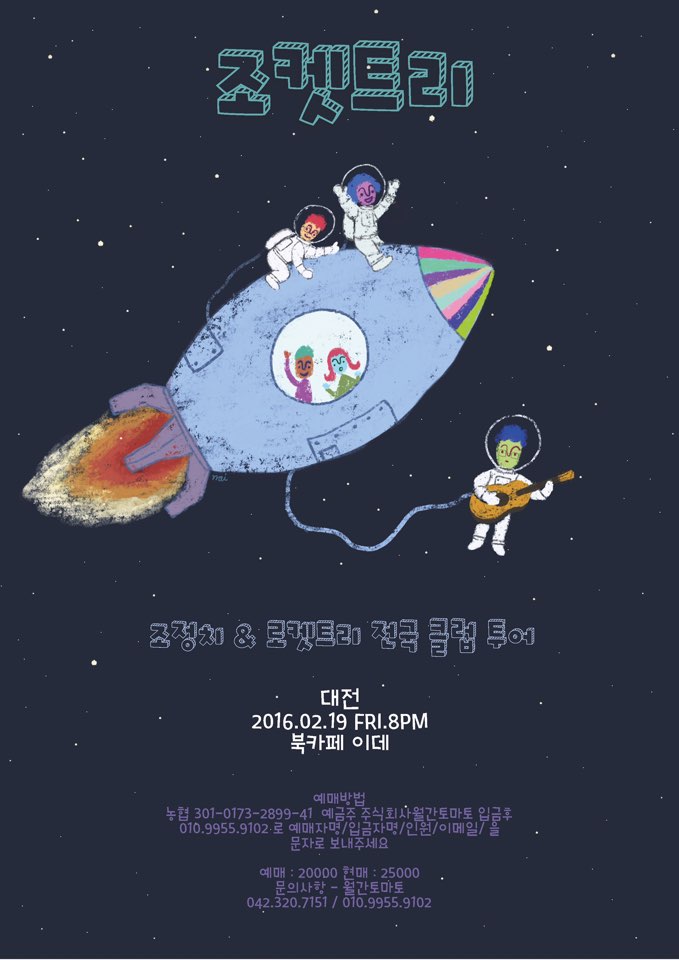-
[1월 105호] 마지막 허들을 남는다_영화감독 박성진

치매에 걸린 엄마와 둘이 사는 소녀 다해가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허들 경기를 본다. 다해는 그 길로 곧장 엄마에게 허들을 가르친다. 운동장에 선 둘 사이에서 처음으로 ‘대사’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뛰어!” 처음엔 무서워하던 엄마도 금세 눈앞의 장애물을 곧잘 뛰어넘는다. 하다 보니 재미있기까지 하다. 허들 하나가 둘 사이에 대화를 주고받게 하고, 둘 사이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2015 대전충남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영화 <허들>이다.
트럭 운전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문대학에 진학했어요. 군 제대하고 바로 트럭 운전을 시작했죠. 매일 똑같은 일이었어요. 스물넷부터 스물아홉까지 트럭 운전을 했어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난했어요. 빚도 있었고 돈을 벌어야 했죠.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트럭 운전하면서도 많은 걸 시도했거든요.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웠어요. 대부분 두 달 정도 하다 그만뒀지만요. 그때는 뭔가 하고 싶어서였다기보다는 탈출구를 찾았던 것 같아요.삶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잖아요. 그게 노동자의 삶이기도 하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살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계속 다른 걸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스물아홉이 되고, 생각했어요. 이렇게까지 돈을 벌어도 사장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럴 거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느낀 거예요. 서른 되던 해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박성진 감독은 천안에서 태어났다. 스물아홉까지 천안을 떠난 적이 없다. 어릴 때 영화를 하고 싶었다거나,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었다거나 하지 않았다. 서른 넘어 우연히 시나리오 한 편을 만났다. 읽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심장이 뛰었다. 이렇게까지 가슴 뛰어 본 적이 있었는지 스스로 물었다. 살며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다른 생각은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시나리오 한 편이 마음을 움직였다. ‘내 안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다.
연예 기획사
백만 원을 들고 서울로 갔다. 고시원에 들어갔고, 일자리를 구하다 연예기획사에 취직했다. 운전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일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도 않았다.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로드매니저로 일했다. 많은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때 전계수 감독의 [미로] 시나리오를 읽었다.“기획사였으니까 회사에 가면 시나리오가 널려 있었죠. [미로] 순식간에 빠져들어서 읽었어요. 시나리오에 정말 많은 고민이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회사 다니면서 영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한다거나 도움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로드매니저가 영화 한다고 하는데 누가 도와주겠어요. 2013년 5월에 써서, 2014년 7월에 찍었어요. 6개월 정도 편집 기간이 있었고요.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허들] 전에 아는 분들과 함께 작업도 했지만, 제게는 [허들] 이 첫 영화예요.”
어딘가에서 고단한 하루를 마친 딸이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온다. 딸의 고단한 하루는 다시 시작이다. 집에는 치매에 걸린 엄마가 있다. 치매에 걸린 엄마와 함께 사는 딸, 두 사람이 영화 [허들]의 주인공이다.
“마지막에 엄마와 딸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장면 때문에 [허들]을 시작했어요. 방송에서 치매에 걸린 사람과 가족이 나올 때면 그들의 ‘효’만 부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이 있겠어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도 일상이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언제나 그런 삶이 궁금했어요. 단편영화는 영화제가 아니면 상영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제에 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부산을 시작으로 여덟 군데 정도 영화제에서 상영했어요. 영화제를 돌면서 많이 했던 말이 진짜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였어요. 딸의 심정을 똑바로 바라보고 찍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영화 [허들] 스틸컷
영화
치매에 걸린 사람과 가족, 그들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깊은 고민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이 취재하고 접근했어야 했다는 걸 알았다. 진짜를 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해 놓고 흉내만 냈다. 그 이후부터 영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너무 미안한 영화라고 말하곤 했다. 너무 깊이가 없었던 것 같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만약 시간을 더 들였으면, 인물에 더 가까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만큼 자격이 있느냐는 고민이었어요. 지금이라면 항상 뒷모습을 찍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찍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고민 없이 찍은 거죠.”영화 현장에서 많은 걸 느꼈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 학교에 다녀야겠다.’는 마음이 커졌고, 2015년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로 편입했다. 학교에 가면 영화를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다.

“요즘엔 기본적으로 대학을 모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낄 수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세종대학교에는 포트폴리오 제출을 통해 편입하는 전형이 있었어요. <허들> 덕분에 편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1년 다녔어요. 학교 다니는 게 생각했던 것만큼 큰 의미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며 한 달에 한 편씩 단편영화를 찍고 있다. 매번 작업할 때마다 ‘정말 영화 속 인물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는가에 관한 고민과 반성이 이어지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고 싶다.
“내년 정도에 장편을 찍을 것 같아요. 큰 자본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 누가 되었든, 누군가의 삶을 조밀하게 바라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허들> 때도 그랬고,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학교 다니며 한 달에 한 편씩 단편영화를 찍고 있다. 매번 작업할 때마다 ‘정말 영화 속 인물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는가에 관한 고민과 반성이 이어지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하고 싶다.
“내년 정도에 장편을 찍을 것 같아요. 큰 자본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해요. 앞으로 누가 되었든, 누군가의 삶을 조밀하게 바라보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허들> 때도 그랬고, 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글 사진 이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