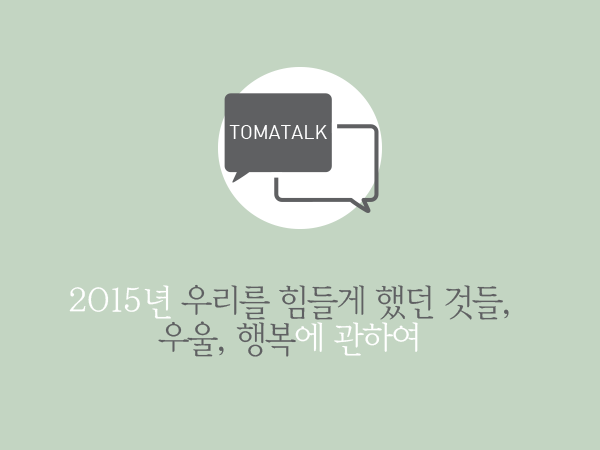-
[1월 105호]시간이 주는 이야기 2

경로당에서 만난 어르신들에게는 다가올 시간보다 지나간 시간이 더 튼튼하게 쌓여 있다. 살아 있는 동안 더는 변할 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마침표를 찍을 것인가. 어르신들에게 시간의 흐름은 어떤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을 것인지, 기다리는 과정이다.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행복이다.
다가올 시간은 담담할 뿐이다
12월 30일에 떠난 대전 서구 괴곡동 선골경로당에는 무려 아홉 명의 할머니들이 앉아 있었다. 2016년 여든하나인 할머니가 일어나 잔심부름을 한다. 사 들고 간 빵에 물 한 사발씩 앞에 두고 먹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요즘은 자식들이 돈 달라고만 안 해도 다행이여.”
“아니여. 무조건 갖다 써도 고마운 줄만 알면 다행이여.”
“그려. 요즘에 얼마나 세상이 무서워. 집구석이 안될라면 엄한 자식도 막 생기는 거여.”
“그래도 우리는 그런 자식 하나도 없어. 다들 지들 벌어 먹고사니께. 그게 힘들어도 다행이여.”
농사짓는 거 힘들지 않으시냐는 질문 하나에 곳곳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아홉 명 할머니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올해 여든넷이다. 모두 스무 살 무렵 시집와 지금껏 선골마을에 살았다.
“아이고. 우리 때는 어른들 무서워서 뜯도 못했어. 시어머니가 물렁한 사람은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는 어디 둘만 모여 있어도 쫓아 나와 요렇게 지켜봤어. 딴짓 하는가 보려고 나온 거지. 눈 한 번 못 팔고 살았어.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제야 이야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어?”
다가올 날의 이야기보다는 지나간 날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앞으로는 지금처럼 일할 수 있고,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 말고 바라는 게 있으면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자식들은 잘 살 수 있는 나라였으면 한다.
“앞으로 바람은 큰 거 있나. 여기도 그린벨트 좀 풀렸으면 좋겠어. 마을에서도 개발되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사는 데 그린벨트 풀리면 난리도 아니라고들 하대.”
“그거 풀리면 아무도 농사 못 지어. 이렇게 계속 사는 게 편안한 거일지도 몰라. 땅 좀 있다고 서민들 세금이나 물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땅 있으면 뭐해. 그걸 가지고 가져다 팔면서 쓸 것도 아니고.”
“그저 세금 많이 안 올리고 서민들 편안하게 해 줘야지.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다 똑같아. 누가 해도 그래. 노태우도 보통사람이라고 해 놓고 도둑질한 게 보통이 아니잖아.”
“나라에서 농민들을 너무 죽여. FTA 때문에 쌀값도 얼마나 내려갔어. 아이고. 우리야 여자 대통령이라고 박근혜 편을 들었지만, 정치가 뭐 혼자 하는 거여? 다 똑똑한 놈들이 서민들만 죽어나게 하는 거야.”
잘 모른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젓더니 정치 때문에 겪었던 진짜 불편함이 속사포처럼 나온다. 그저 자식들이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인데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말 때문에 ‘우리’보다는 자식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다 건강해. 여기 있는 이들 다 밥 한 공기씩 먹어. 안 그려? 나 그짓말 안 혀.”
농사철 되면 바쁘게 보내다가 12월 되니 이제야 한가해져 따뜻한 경로당에서 만나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들의 가장 큰 걱정은 농사다. 지난해 가뭄이 심해서 농사지을 때 힘들었다. 좋았던 일 역시 농사다. 올해 가을 추수 때 가물어서 추수가 잘 되었다. 앞으로 사는 날은 일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담담하다.
“옛날에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많았는데 다 죽었어. 이제 할아버지들은 얼마 남지도 않았어. 아이고.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살아서 뭐혀. 일을 못 하면 죽어야 하는 겨. 열심히 살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간다고. 젊어서부터 꾀부리고 놀던 사람들은 진작에 다 죽었어. 젊은이들은 몸만 건강하면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혀.”
곁에서 얼굴 보고 부대끼며 살았던 이웃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살아 있는 순간마저도 죽음과 가깝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다가올 일은 다가올 일이라는 듯, 모든 것이 담담하고 모든 것이 놀라울 것 없는, 그래서 무엇이나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이다.
농사철 되면 바쁘게 보내다가 12월 되니 이제야 한가해져 따뜻한 경로당에서 만나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들의 가장 큰 걱정은 농사다. 지난해 가뭄이 심해서 농사지을 때 힘들었다. 좋았던 일 역시 농사다. 올해 가을 추수 때 가물어서 추수가 잘 되었다. 앞으로 사는 날은 일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담담하다.
“옛날에는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많았는데 다 죽었어. 이제 할아버지들은 얼마 남지도 않았어. 아이고. 죽을 때 되면 죽어야지. 살아서 뭐혀. 일을 못 하면 죽어야 하는 겨. 열심히 살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간다고. 젊어서부터 꾀부리고 놀던 사람들은 진작에 다 죽었어. 젊은이들은 몸만 건강하면 게으르지 않게 열심히 살아야 혀.”
곁에서 얼굴 보고 부대끼며 살았던 이웃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살아 있는 순간마저도 죽음과 가깝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다가올 일은 다가올 일이라는 듯, 모든 것이 담담하고 모든 것이 놀라울 것 없는, 그래서 무엇이나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이다.
글 사진 이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