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36호] 에브리맨, 현대인의 초상
에브리맨,
현대인의 초상
김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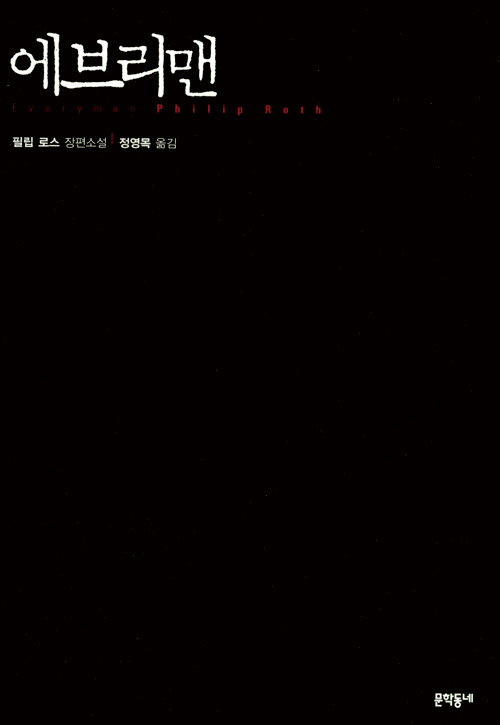
에브리맨(필립 로스, 문학동네, 2009)
지난 5월 25일,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 현대문학의 거장 필립 로스(Philip Roth, 1933~2018)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였다. 코맥 매카시, 토머스 핀천, 돈 드릴로와 함께 ‘미국 현대문학의 4대 작가’로 꼽히곤 하던 작가였다. 사인은 울혈성 심부전. 내가 알기로 그는 50대부터 심장이 좋지 않았다. 그 부고 소식에 한 권의 소설이 떠올랐다. 작가 자신의 분신인 양, 중년 때부터 늘 심장병을 앓다 결국 심장 수술을 하다 죽는 한 남자를 소재로 쓴 소설 《에브리맨》이다.
시쳇말로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벌써 중년이 되어 버린 나도 근래 들어 늙음과 병,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건너건너 인연일지언정, 누군가의 병이나 죽음 소식을 듣게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한다. 카페에서 작업 하다 눈을 들어 발랄한 청춘남녀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풋풋한 젊음이 마냥 부럽고, 다시 저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청춘다운 삶’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물론, 이런 청춘타령이 한갓 망상, 오해에 불과하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냄비 뚜껑을 날려 버릴 듯 펄펄 끓는 욕망에 휘둘리고, 근거없는 자신감과 인생에 관한 백치같은 무지, 그리고 운명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예비해 두었는지 모르는데서 오는 막연한 불안감 등이 버무려진 갈팡질팡하는 영혼의 시절이 청춘인 걸 나 스스로 겪어 봐서 잘 안다. 청춘의 아름다운 운운 따위는 나처럼 이미 청춘을 잃어버린 자들이 막연한 감상에 젖어 떠들어 대는 헛소리일 뿐, 진짜 청춘의 맛은 볶은 지 1년도 더 된 원두로 내린 에스프레소 커피처럼 독하고 쓰기만 하다.
그러면, 혼란과 방황 투성이 청춘을 지나 취직하고 결혼하고 자식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어른이 된 이후부터는 휘파람 부는 시절이 올까? 설마! 그럴리가! 전생에 일개 대륙 정도는 구했어야 그런 행운이 올까? 진짜 혹독한 계절은 이제부터다. 이기적 유전자의 농간이나 관습에 속아 덜컥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아등바등 10년이나 20년쯤 살아가다 보면 한 생이 고작 자식 뒷바라지에 아파트 한 칸 장만하느라 뼛골이 닳아 없어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지 않는가? 물론 요즘은 아내나 남편 몰래 스릴 넘치는 혼외연애도 잠깐 즐기기도 하고, 먹방이나 해외여행도 소소하게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러다 어느 날 덜컥 무슨 병이라도 걸리면 그런 쾌락조차도 영원히 아듀다. 그때부터 인생은 수직낙하, 황금 날개를 달았다 해도 그 추락을 멈출 재간이 없다.
이런 게 인생이란 말인가? 영겁회귀의 철학자 니체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더!” 라고 외쳤지만, 자신이 오십 줄에 들어서자마자 미쳐서 이후 죽는 순간까지 10년간 개고생만 하다 죽었다는 걸 떠올려 보면, 과연 저승에 있는 니체가 그런 인생을 100퍼센트 긍정하며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어할까, 진심으로? 글쎄, 아닐걸? 이왕 생이라는 유배지에 내던져진 이상, 딱 한 번은 어떻게든 버둥대며 살아본다지만, 나도 이번 생 같은 생을 두 번 살아라고 한다면 네버, 네버, 기어코 사양이다.
필립 로스의 소설 《에브리맨》을 읽어 보면, 내 말이 진짜란 걸 알게 된다. 청춘에겐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삶을 비춰 주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고, 청춘을 지나버린 진짜 어른들이 읽으면 “아이고, 이거 거의 내 인생 이야기 같네!” 하며 탄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면, 끊었던 담배도 다시 물게 될 것이다. 필립 로스가 괜히 필립 로스인 게 아니다.
소설 주인공은, 우리도 대개 그러하듯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었지만 ‘먹고사니즘’ 때문에 광고업계로 투신한 남자다. 삶이나 죽음 이후에 관해선 아무런 환상이 없다. 지극히 현세적이고 영악한 전형적인 현대인이다. 무엇보다 그는 우리 존재의 중심이 바로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에게는 죽음과 신에 관한 야바위나 천국이라는 낡은 공상이 통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몸만 있을 뿐이었다. 태어나서 우리에 앞서 살다 죽어간 몸들이 결정한 조건에 따라 살고 죽는 몸. 그가 그 자신을 위한 철학적 틈새를 찾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틈새였다.”
그래, 그의 생각처럼 우리에겐 몸뚱이 하나가 전부다. 탯줄 달린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 결국 먼지와 재가 될 뻣뻣한 시체로 끝나는. 무와 무 사이에 놓인 삶을 위한 철학적 틈새, 몸. 쾌락의 선물이자 불행을 내장한 시한폭탄이기도 한 그것. 그 ‘몸’이 꽃길만 즈려밟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흙으로 지은 집인 육체는 결국 쭈글쭈글해지고, 병에 들고, 그리고 심장이 멈춘다. 병과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들이닥칠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대개 우연이라는 신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 주인공의 인생도 딱 그렇다. 멋모르고 한 첫 번째 결혼이 실패하는 건 정해진 수순이고, 운 좋게 만난 과분하게 훌륭한 두 번째 아내와는 멍청하지만 섹시한 젊은 여자 때문에 이혼당하고, 아들들에게는 경멸당하며, 덧없는 실패담, 우스꽝스런 희극에 불과한 생을 돌아보며 후회와 자책에 시달리는. 그러다 겨우 오십 대 들어 갑자기 찾아온 심장병 때문에 수시로 수술을 받고 고통받다가 결국 죽어 가는. 뒤늦게 자조적으로 자신을 비난한들 무슨 소용일까?
그의 그림 교실에 나왔던 그와 동갑인 우아하고 고상했던 여인. 그녀는 끝내 늙음과 병이 주는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을 감당하지 못해 수면제를 잔뜩 입에 털어 넣고 자살한다. 그러나 그는 이 잔혹한 종말에 맞서 끝까지 투쟁한다. 일흔이 다 된 늙은 몸으로도 여전히 젊은 여성의 육체를 보며 꿈틀대는 욕망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남자- 수컷. 누군가 말한다. 노년은 전투다, 라고. 그러나 그는 말한다. “아니다. 노년은 대학살이다.”
생은, 늙음은 가차없다. 필립 로스의 시선도 가차없다. 늙음과 병과 죽음은 학살처럼 우리의 몸을, 생을 꿰뚫는다. 거부해도, 반항해도, 어떤 달콤한 말로 위로해도 소용없다. 작가는 주인공 딸의 입을 빌어 마치 우리에게 말하듯 외친다. “현실을 다시 만드는 건 불가능해” “그냥 오는 대로 받아들여. 버티고 서서 오는 대로 받아들여.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게 말입니다. (김운하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