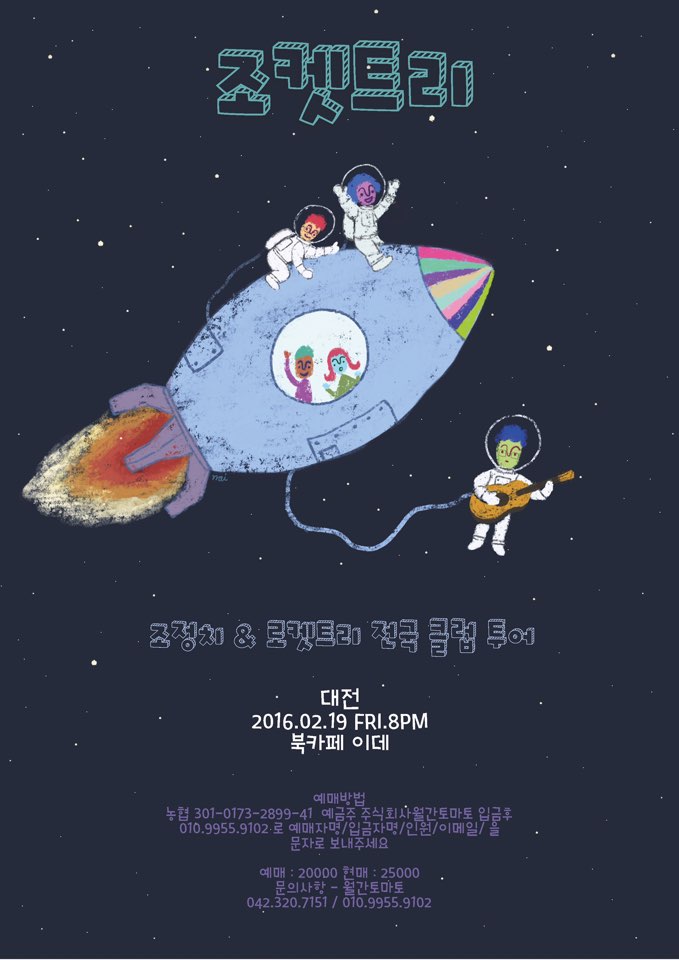-
[1월 105호]책과 함께 깊고 진한 연애를 하는 새해를

벌써 2015년 한 해가 다 저물고 머잖아 또 다른 새해의 태양이 솟아오른다. 올 한 해 강의며 외부 강연때문에 너무 분주했던 탓에 정작 개인적으로 읽고 싶었던 책은 그리 많이 읽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도 올해 문학 수업을 하면서 새롭게 재발견한 작가와 작품들도 있었다. 서머셋 몸과 버지니아 울프, 그리고 파트릭 모디아노 같은 작가들이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좋은 소설은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읽을 때마다 그 맛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꼼꼼하게 읽고 또 읽을수록 그 작품의 다양하고 진정한 깊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쁨이 있다.
독서나 책에 관련된 강연에 나설 때마다 ‘1년에 백 권 읽기’라든가 ‘3백 권 읽기’라든가 하는 식으로 그저 읽은 권수를 채우기 위한 독서에 반대하는 까닭도 사실 거기에 있다. 물론 기본적인 교양의 축적도 필요하고, 그런 교양을 위해선 어느 정도 폭넓고 다양한 독서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읽기 보다는 깊이 읽기를 더 선호하고, 또 그것이 독자의 정신적 행복과 지혜를 쌓는 데도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잡다하게 수 천 권 읽은 사람보다, 깊이 있고 좋은 책 백여 권을 반복해서 여러번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책들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사람이 더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고, 한 권의 책에서 얻어 내는 기쁨도 훨씬 더 클 수 있다.
예를 들면 버지니아 울프의 《댈러웨이 부인》이나 서머셋 몸의 《인생의 베일》과 《달과 육펜스》 같은 작품 또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같은 작품들은 결코 단 한 번 읽어서는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없는 작품들이다. 작품에 관련된 사소한 디테일 하나조차도 놓치지 않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해서 찾아본다거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다른 작가들이나 작품들에 관해 꼼꼼히 찾아서 그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참고하면서 읽어 낸다면, 단 한 권의 소설도 여러 권의 책을 읽는 것만큼이나 효과가 있다.
2015년에 읽었던 여러 권의 소설을 떠올려 본다. 수업 때문에 여러 권의 소설을 동시에 읽기도 했는데, 그러다 보니 때로는 머리 속에서 여러 소설 캐릭터들이 들썩거리고 왕왕거리는 듯할 때도 있었다. 소설은 결국 인간과 인간의 삶, 세상사를 다루는데, 소설을 읽다보면 마치 인간 희극의 경연장을 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인간사에 좀 무관심하고 초연해지고자 하는데 소설을 읽으면 어쩔 수 없이 소설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파란만장한 개인들의 삶,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들,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미성숙과 탐욕, 통제 불가능하고 불가해한 운명이 손을 잡고 빚어내는 희비극들에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휩쓸리게 되고 만다. 그리고 그런 감정적인 격랑들이 빚어내는 드라마에 조금은 진저리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인생의 오색 베일 너머엔 언제나 씁쓸하고 잔혹한 우스꽝스러움이. 흐린 한바탕 꿈 같은.
지금 나는 서머셋 몸의 《인생의 베일》의 한 대목을 떠올린다. 이 소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의 모든 어머니나 딸들이 읽어볼 만한 그런 소설이다. 인생이나 인간,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성장해서 서투른 결혼을 하고, 남편이 아닌 남자에 대한 욕망의 덫에 빠져 과오를 범하고, 그런 시행착오로 가득찬 고통스런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어른, 즉 자신이 누구인지, 삶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숙해 가는 젊은 여주인공 키티.
그녀가 높은 산 위의 절에서 탁트인 시야 아래로 펼쳐진 강물과 논밭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하는 생각은, 자기자신에만 빠져 있을 때와는 다른 바깥의 관점, 즉 대자연이나 하늘, 먼 곳의 관점에서 인간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느끼곤 하는 감정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빠져 있을 땐 자기의 고통, 고뇌, 아픔, 상처,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 같지만,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 바깥에서 바라보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겪는 모든 번뇌가 얼마나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녀가 높은 산 위의 절에서 탁트인 시야 아래로 펼쳐진 강물과 논밭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하는 생각은, 자기자신에만 빠져 있을 때와는 다른 바깥의 관점, 즉 대자연이나 하늘, 먼 곳의 관점에서 인간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흔히 느끼곤 하는 감정을 드러낸다. 자신에게 빠져 있을 땐 자기의 고통, 고뇌, 아픔, 상처, 이것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문제 같지만, 자기중심주의를 벗어나 바깥에서 바라보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겪는 모든 번뇌가 얼마나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들(키티와 워딩턴)은 작은 건물의 계단 위에 앉아서 넘실대는 강물과 병마에 시달리는 도시를 향해 구불구불 뻗어난 길을 바라보았다. 총안이 뚫린 성벽이 보였다.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강물의 모습에서 사물의 무상함과 애수가 밀려왔다. 모든 것이 흘러갔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흔적은 어디에 남아 있단 말인가? 키티는 모든 인류가 저 강물의 물방울들처럼 어디론가 흘러가는 것만 같았다. 서로에게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여전히 머나먼 타인처럼, 이름 없는 강줄기를 이루어 그렇게, 계속 흘러흘러, 바다로 가는구나. 모든 것이 덧없고 아무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때 사소한 문제에 터무니없이 집착하고 그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이 너무나 딱했다.”
우리는 결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풀잎 끝에 매달린 한 방울 새벽 이슬에 불과하며, 태양이 솟구쳐 오르면 순식간에 증발하여 사라질 운명에 불과한, 그래서 거의 무에 다름 없는 존재들일 뿐이다. 어쩌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란 너무나 가볍고 가벼워서, 거기에서 중요하거나 진지한 것이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쉬엄쉬엄 가거나 아등바등 달려 가거나, 혹은 열광하고 도취하며 취한 듯이 흔들리면서 가거나 간에, 모든 삶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고, 영원한 휴식이 휴가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나는, 이제는 아마도 한두 가지 제한된 대상에 대한 ‘초연한 열정’ 속에서 단순하고 고요하게, 소박하고 절제된 삶을 살고 싶은지도 모른다.
한 해를 새로 시작하는 이 순간에 하필이면 저 문장을 인용한 것은, 새해엔 좀 더 넓고 관대한 마음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들도 한철 겨우살이처럼 가련한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으며 “사소한 문제에 터무니없이 집착하고 그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 때문이다. 이 덧없는 세상에서 좀 더 사랑하고, 갈등하기보다는 화해하고 용서하며, 따뜻한 온기가 넘치는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그리고 월간 토마토 독자들도 아름다운 몇 권의 책과 함께 짧은 연애가 아니라 깊고 진하고, 아주 오래가는 연애를 하는 새해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글 김운하